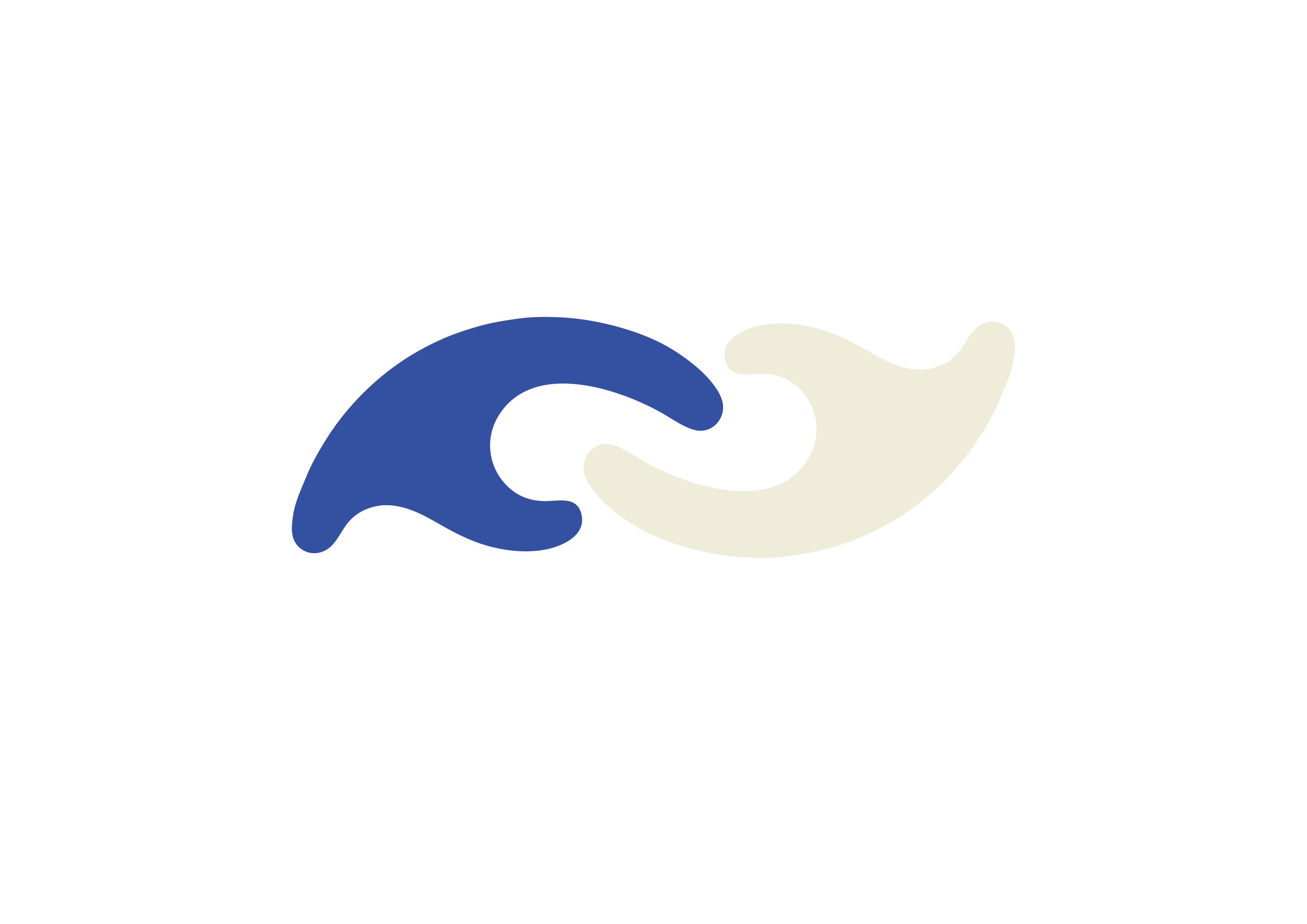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광고
광고
나들목교회에서 시간들은 나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1. 일관된 길을 찾아 떠났던 목회 여정의 한 지점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이 길로 접어들면서 나는 계속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미셔널 처치에 관한 소명이었다. 목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학생 시절 교회에서 선교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회사를 그만 둔 이유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 이후 선교사 훈련과 경험을 쌓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결국 미셔널 처치였다.
미국에서 우연하게 공부한 학교도 미셔널처치에 올인하여 가르쳤다. 그리고 그 이후 사역한 교회도 미셔널처치의 중도 노선을 걷고 있는 리디머교회가 개척한 교회였다.
미국에서 계속 살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김형국 목사님을 만나 한국에 들어왔다. 미셔널처치의 실례들을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나들목교회 가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건너왔다.
3년 동안 실제로 많이 배웠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미셔널처치에 대한 현실을 배웠다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결국 이론 보다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했다. 물론 나들목교회는 이론적인 훈련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추었다.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이다. 즉 내 소명과 내 삶의 의미와 인격, 정체성 이런 실존에 관한 문제이기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들목의 직장을 벗어나야했다. 칼 융이 말한 대로, 인내심 깊은 창조주께서 삶의 의미에 관한 운명적 질문을 억지로 주입하지 않기에 삶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게 물어야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필요했고 부목사로서는 안식년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안식년을 갖기로 했다.
2. 함께 사역한 동료들 속에서 내 자신의 사역정체성을 다듬는 시간이었다.
사역하면서 늘 염두에 두었던 것은 내가 동료들과 더불어 한 몸의 공동체성을 얼마나 잘 실현할 것인가였다. 그러려면 내가 그 속에 잘 연합되어야했다. 나이나 경험으로 밀어붙여도 안되고 오히려 그런 것이 섬기기 위한 좋은 요소로 작용해야했다. 또한 성격대로 거칠게 행동하기 보다는 동료들 속에 나를 다듬어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한다. 정확하게 어떤 행동인지를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행동했던 것 같다. 다행이 동료들은 진실되었고 마음이 열려있는 동생과도 같은 이들이어서 더불어 성장했으리라 믿는다.
그래서 인지 동료들에게 정이 많이 들었다. 함께 밥먹고 회의하고 엠티가고 가서 또 회의하고, 이런 현실을 사랑할 수는 없었지만 정이 붙어버렸다.
고마운 친구들, 특히 성장사역, 공동체사역 센터의 친구들에게 고맙다. 나이들어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나이 무시하고 같은 또래처럼 여겨줘서 고맙다.
728x90
'가족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브루클린 브릿지 (0) | 2016.08.25 |
|---|---|
| 체리힐장로교회에서 사역1 (0) | 2016.08.25 |
| 가정교회 엠티 2016년 (0) | 2016.07.15 |
| 와일드구스에서 하나님을 찾다. (0) | 2016.07.05 |
|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배우다. (0) | 2016.06.29 |
Missional Communication지금 기독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과 소통하는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세상이 소통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였다. 공동체라는 주제로 삶을 엮어가다보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보일 것이다.